세례명을 지어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가끔 뵙고 있다. 그 자리에는 가까이 지내시는 신부님과 처남 신부님이 동석하고는 했다. 신앙생활에서 마주치는 고민거리를 여쭙기도 했고, 사제의 일상에서 나오는 소탈한 이야기들로 언제나 따듯한 저녁이 되고는 했다. 어쩌면 사제와 평신도라는 차이가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선후배들의 다정한 해후 같은 것이어서 실로 감사할 따름이다.
그 자리에서 어느 날 ‘명동밥집’을 알게 되었다. 한 분은 책임을 맡고 있고, 한 분은 변복한 암행어사처럼 숨은 봉사자였다. ‘노숙인과 우리는 종이 한 장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봉사가 아니라 위안을 얻는 겁니다.’ 그날 그렇게, 한 달에 두 번 ‘밥집’에 가는 일은 시작되었다.
밥집에 와서 밥을 먹지 않는다
밥은 밥솥에서 밥그릇으로 옮겨가고
닭고기가 들어간 카레에 계란 프라이
미역국에 김치까지 1식 1국 3찬
밥은
바람결 따라 펄럭이는 천막을 따라
수만의 바람이 되어
바람으로 흘러간다
카레가 묻은 밥그릇과
미역이 붙은 국그릇과
고춧가루 새빨간 스테인리스 종지가
끝도 없이 쉬지 않고 몰려드는
주방 한 켠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시편 8,4)
바람이 모여 바람이 인다
수만의 바람이 인다
발바닥이 아려오는 늦은 오후
밥집에 와서 밥을 먹는다
- 졸시 <수만의 바람 - 명동밥집 1> 전문
처음에는 식판조가 되어 주방에서 배식대로 음식 나르는 일을 했고, 가끔씩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았다. 묵묵히 음식을 담는 배식조와 그것을 나르는 홀서빙의 모습을 보노라면, 수도원의 대침묵이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밥집 손님을 부르는 호명 소리, 식판 부딪는 소리, 발걸음 소리 사이로 유난히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리는 풍경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밥심이 천심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헐벗은 몸으로 밥집을 찾는 노숙인들이라고 하여 영혼까지 황폐화된 건 아니다. 그들도 우리도 밥심으로 살고, 그것을 하느님 마음으로 알고 배가 부르는 사람이라는 걸 ‘한 달에 두 번’ 깨달으며 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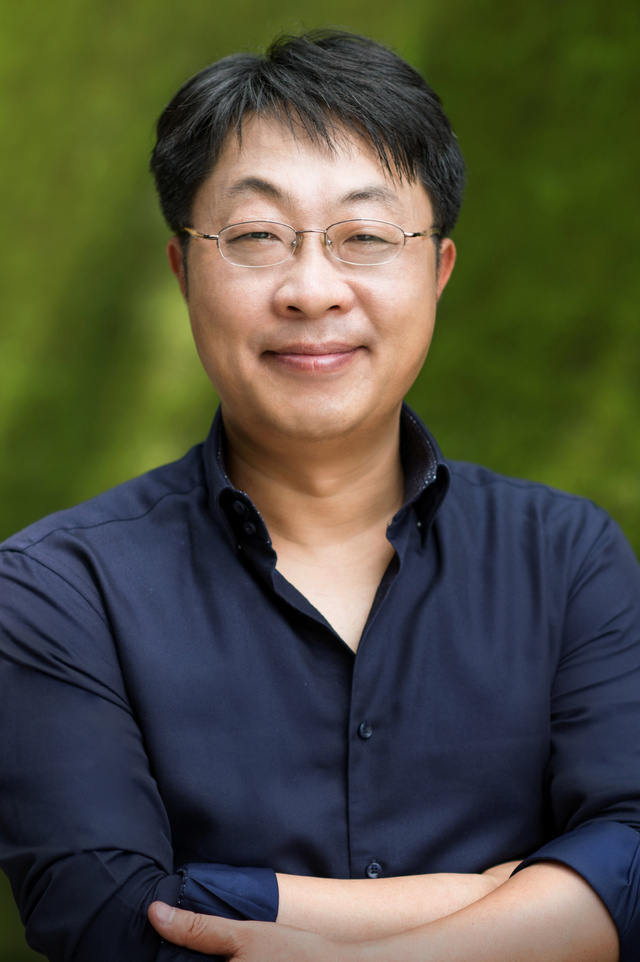
글 _ 김재홍 요한 사도(시인·문학평론가, 가톨릭대 초빙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