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명동 거리만 아니라 종로와 광화문까지 한산하기만 한 때였다.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것처럼 온 나라가 입을 틀어막고 쉬쉬하며 살던 때였다. 그만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일상에 큰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교중 미사에 참례하고 가족들과 점심을 먹으려던 참이었다. 한 선배의 전화가 왔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한국평단협)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를 책임지고 편집할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였다. 학생 때부터 교지를 편집한다든가, 시인으로서 시집을 간행한 바 있고, 회사에서 홍보지를 만드는 데 참여한 적도 있어서 편집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었으나, 한국평단협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몰랐다. 쉽게 화답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마침 학위 논문을 쓰고 있던 때이기도 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되었다. 모바일 시대의 인쇄 매체라는 점을 고려하고, 열독률을 높일 방안을 찾아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그리하여 들고 다니기 좋도록 판형을 작게 바꾸고, 두께도 줄이기로 했다. 그러자니 디자인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하고, 그에 따라 원고 분량과 내용도 바뀌어야 했다. 내용과 형식을 모두 변경하는 만큼 몇 달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편집위원들과 대면 회의를 할 수 없었던 점이다. 여덟 권을 발간하는 동안 전체 회의를 한 번도 갖지 못했다. 두세 명씩 만나 겨우 점심을 드는 정도에 그쳤다. 2년 동안 오직 SNS를 통해 아이템을 모으고, 필자를 선정하고, 원고 청탁서를 보냈다. 그럼에도 열심히 봉사해 준 편집위원들과 옥고를 보내준 여러 필자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그렇게 편집장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레 한국평단협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이 입국한 뒤 ‘명도회’가 결성되었다는 기록 외에도 1949년 전국 평협 창립총회가 있었고, 1968년에는 공식적으로 주교회의의 승인을 거쳐 ‘한국가톨릭 평신도사도직중앙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린 것도 알게 되었다. 또 그해에 ‘평신도의 날’이 제정돼 올해로 58주년이 되는 것도 알았다. 류홍렬 라우렌시오 초대 회장을 비롯해 신앙심 깊은 역대 회장들의 면면도 알게 되었고, 평신도를 ‘사도직’이라 부르는 의미도 어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왜 하느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자꾸 부르시는지 모를 일이 또 생겼다. 어렵사리 편집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한국평단협의 기획홍보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다. 홍보라면 전 직장에서 경험하기도 했고 소식지를 발간하는 일도 그 일환이라 부담이 덜했지만, 기획이란 한 단체의 비전과 조직, 업무, 예산까지 모두 파악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 감히!
그러나 다시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직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비록 기대하는 만큼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한국평단협의 여러 모습을 지켜보면서 공부를 해오고 있다. 살면서 배우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봉사자에게 내려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라는 생각이다. 봉사는 자신의 재능을 베푸는 게 아니라 배우고 공부하는 일이라는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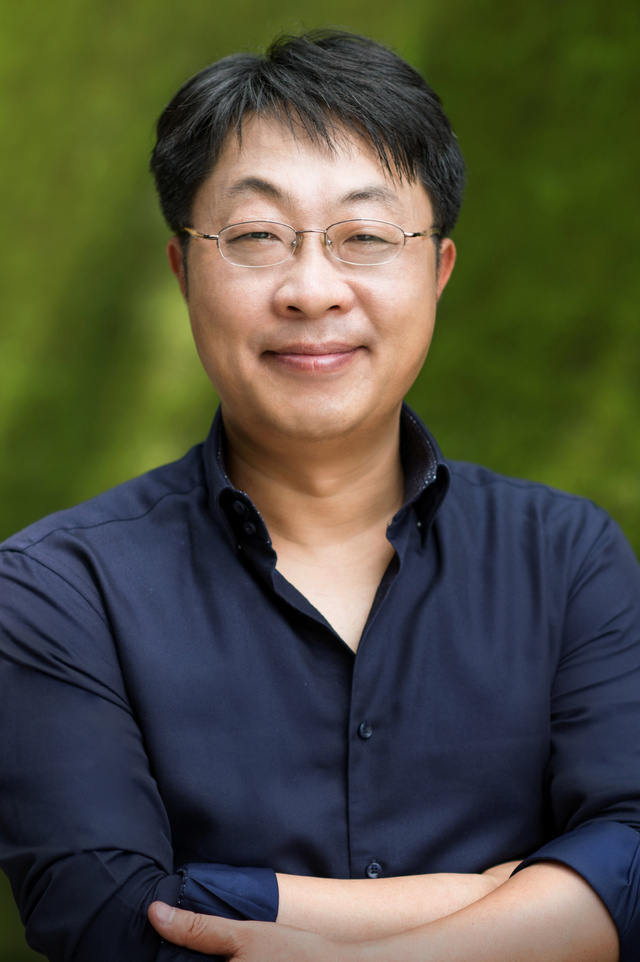
글 _ 김재홍 요한 사도(시인·문학평론가, 가톨릭대 초빙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