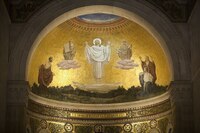낙장불입(落張不入). 글 모르는 어린 아이 빼고 이 말을 처음 접하는 이는 별로 없을 듯하다.
노름판깨나 기웃거려본 사람은 물론이고 집안 내력으로 모처럼 온 가족이 둘러앉는 명절 때도 노름의 ‘노’자도 떠올리지 않는 필자와 같은 이들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을 법하다.
어린 시절 유명한(?) 고사성어 정도로까지 알고 있던 이 낙장불입이란 말은 아마 노름판이나 현실에서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 쯤으로 통용되는 듯하다.
숱하게 회자되어오다 이제는 일반인들의 뇌리에서 조금은 비켜선 듯한 한·미 FTA에도 이런 낙장불입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른바 ‘래칫 조항’(역진방지 장치)이 바로 낙장불입과 상통하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협정 체결 때 유보 목록에 들지 않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서비스 시장 영역은 영구히 자동개방 영역으로 남도록 한다. 설령 사후에 지나친 개방으로 공공성 훼손이나 해당 산업의 위축 또는 양극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개방 철회나 축소 등의 방식으로 시장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아무리 국민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이미 민영화된 서비스를 다시 공공재로 환원할 수 없다는 말이다.
문제는 놀이 삼아 벌인 화투판에서는 인간적인 호소나 다중의 협박성(?) 회유 등으로 웃는 낯은 아닐지언정 판을 되돌릴 여지라도 있지만 이 조항에서는 ‘개평’은 고사하고 ‘국물’도 없다는 것이다.
물, 전기, 의료 등 국가의 공공서비스를 한 번 민영화하고 나면 문제가 생겨도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은 불문하고서라도 지금보다 몇 배 비싼 서비스 비용을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닥칠 지도 모를 일이다. 나아가 이런 조항들로 우리 정부의 정책 자율성이 침해당하리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고, 그만큼 규제를 받지 않는 초국적 자본들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나 지도층 인사들이 늘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우리 현실에 맞지 않으면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국제 관행을 무시한 행태인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겉으로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역설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부닥치면 ‘국제관례’를 잘 모르는 실무자 핑계를 대며 국민들 속에 또 한 번 불을 지르는 것이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대국민 정책’이 아니던가.
지금은 물 건너 간 것 같이 보이는 한반도 대운하도 마찬가지다. 한 번 파낸 땅 다시 메울 수 있다지만 그 땅도 땅 나름이지 전 국토에 걸쳐 있다시피 한, 그것도 이미 물길이고 생태계고 모두 바뀌어버린 땅을 되살리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게 상식이다. 한 마디로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낙장불입의 상황이 생태계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어린 아이도 수긍시키지 못하는 ‘건전한’ 상식이 빠진 채 ‘상식을 뛰어 넘는’ 파괴만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말로 견강부회하는 ‘못 먹어도 고’식의 삶의 방식으로는 파투(破鬪)라는 결과 밖에 나올 게 없는 게 당연지사다.
슬슬 따뜻한 아랫목이 떠오르고 오손도손한 분위기가 그리워지는 계절이 깊어가고 있다. 덩달아 예의 ‘낙장불입’ 카드가 힘을 쓸 상황이 여느 때보다 잦아질 지 모를 일이다. 놀이판에서 되돌릴 수 없는 카드를 만지작거릴 때의 답답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는 없어야 할 텐데….
서상덕 취재팀장
Catholic Pick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