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톨릭대 전례연구소「한국의 제천의례」발표회




전례 토착화를 위한 정지작업 유교 신과 인간의 대화적 화답의 구조 민간신앙과 복합된 이중적 요소 민속불교 무속 도덕적 가치보다「몸의 기도」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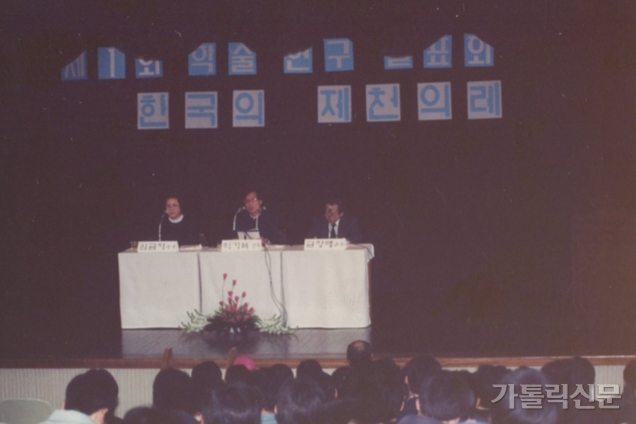
수원가톨릭대학 전례연구소는 「한국의 제천의례(祭天儀禮)」를 주제로 11월 7일 오전 9시 30분 수원가대 대강당에서 제1회 연구발표회를 가졌다. 6개 대신학교중 유일한 전례연구소를 갖고있는 수원가톨릭대는 89년부터 전례토착화를 위한 한국 고유문화전통수용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를 펼쳐 왔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한 최기복 신부(수원가톨릭대교수)의「유교의 제천의례」박일영 교수(대구 효성여대 종교학과)의「무속의 제천의례」홍윤식 교수(동국대 국사교육학과) 의 「한국 불교의 신앙의례」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최기복 신부(유교의 제천의례)
유교의 궁극자(窮極者) 관은 시대와 학파에 따라 서로 다르고 다양하나 궁극자에 대한 감사와 정성의 제천의례만은 계속 봉행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고대와 삼국시대의 전통적인 고신도적(古神道的) 제천의례를 바탕으로 외래의 유가적(儒家的) 제천의례를 수용, 신탁하여 체계화해 조선말기까지 왕이 제주가 되어 제사를 봉행해 왔다.
유교의 제천의례는 비록 천자(天子)만이 천하민을 대표하여 행할 수 있고 일반 백성들은 참례마저 배척되었지만 그것은 만백성을 위한 천하민의 제사였다.
유교 제천의례의 특성중 하나는 타신(他神)을 대동한 합사(슴祀)였다는 점이다. 즉 절대자인 천(天) 혼자 제사를 받지 않고 지상에서 천자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정사를 살피며 백성의 칭송을 받는 것과 같히 제천의례에 있어서도 인간생명과 삶에 도움을 주는 일(日) 월(月) 산천(山川) 신들과 조상신도 함께 제사를 흠향하는 것이다.
유교 제천의례의 구조는 신과 인간과의 대화적 화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天)이 생명과 은혜를 베푸심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감사의 보답으로 정성의 제물을 드리며, 정성을 흠향한 신은 화답으로 강복과 함께 복물(福物)을 내려준다.
이러한 유교 제천의례의 깊은 뜻은 생명의 존엄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생명의 뿌리의식과 생명존엄성을 심화시키며 생명의 근본인 천(天)과 선조(先祖)는 물론 타 존재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해준다.
또한 유교의 제천의례는 신앙의례와 수기안인(修己安人)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하며 천하일가(天下一家) 사상과 만물 일체의식(萬物一體意識)을 갖도록 자극한다.
▦ 박일영 교수(무속의 제천의례)
한국 무속신앙은 상고대이래 오늘날까지 한민족의 근원적인 해답추구의 상징체계로 기능해 왔다.
무당은 그 근원적 해답의 상징체계로서의 무속종교를 담당하는 전문가이다. 무당이 제시하는 해답은 궁극성의 총체인 하늘이 아니라 인간의 일상성을 넘어서는 초인간적 힘에 의거한다는 점이 무속신앙의 특징이다.
무당은 이러한 힘을 몰아경을 통해 경험하고 남들에게 보여준다. 무당은 이러한 힘에의 정향을 인간 삶의 실제적 일상성과 관련지워 기복양재(祈福攘災)라는 현실적 목표로 향하게 한다.
그 결과 무신(巫神)들은 실용성이 있는 동안에만 신령으로 기능하며, 신봉자의 공감을 잃게되면 제장(祭場)에서 사라져가는 운명을 지닌다. 무신들의 생사소멸의 기준이 이렇듯 실용성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힘있는 존재라면 그것이 무속의 체계안에 있든 밖에 있든 개의치않고 신봉하는 종교혼합성을 무속신앙은 강하게 띄고 있다.
무속 의례는 멀리있는 지고존재인 하늘로부터 충족되지 못하는 종교적 심리를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하늘에 대한 신앙체계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에서 궁극적인 해답의 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하고자하는 한국인 특유의 강한 종교심성을 감지하게 된다.
무속 의례는 실존적인 고통, 비구원의 상황 한(恨) 살, (煞), 탈, 역(逆), 「재수 없음」과의 정면대결보다는 한이 품고있는 의미를 감지, 수용해서 풀어내는 한풀이를 동원하여 삶의 제반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따라서 한풀이는 도덕적 가치, 덕목, 이념적 체계를 내세우기보다는 몸짓이나 연희를 통해 신들을 즐겁게 만들어서 궁극적인 해답을 찾아가는「혀의 기도」가 아닌 「몸의 기도」 를 드리는 민중의 종교형태이다.
▦ 홍윤식 교수(한국불교의 신앙의례)
민속불교란 사회에 수용되고 민중사회에 유포된 불교를 말한다. 여기에는 비록 고도로 발달한 불교의 관념체계가 결여돼 있다 하더라도 한국사회에 있어 불교적인 생활이 어떻게 영위되었으며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생생히 담겨져 있다.
민속불교란 한마디로 불교에 대한 민중의 구체적 관심사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이는 민중의 현실적 생활과 깊은 연관을 갖고 신앙되어지고 실천돼온 것이다.
따라서 민속불교는 세시풍속의례, 일상 신앙 의례, 소재(消災) 신앙의례, 사자(死者) 신앙의례, 기타 불공신앙의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세시풍속의례는 석가의 출생 출가, 성도, 열반 등의 불교의 4대 명절의례와 일반적 세시풍속의례를 뜻한다.
일상신앙의례는 불교신앙인에 의한 조선예불의례를 들수 있으며 소재신앙의례는 재난을 소멸하기 위한 의례이다. 사례신앙의례는 민속불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49제 수륙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불교신앙의례는 그 구조적 성격에 따라 자행(自行)과 화타(化他)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자행의례는 수도를 위한 수행의례와 보은의례가 있고 출가자 자신의 신앙발전과 덕행에 있어 중요한 의례이다.
화타의례는 오늘날 불교사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례로 출가자가 재가자(在家者)의 요청에 의해 가지기도(加持祈禱)하고 그 선근공덕(善根功德)을 사자(死者) 혹은 일체중생에게 회향(回向)하는 의례이다.
불교신앙의례는 당초 자행적 수행의례에서 시작, 차차 복합적인 신앙요소를 수용내지 포용해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즉 순수 불교의례는 재래의 민간신앙의례와 복합돼 민속불교화되고 재래민간신앙적 의례는 불교신앙의례와 복합됨에 따라 불교화됐다.
리길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