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콘서트’와 ‘별빛콘서트’




전시공연 PD라는 업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회화사의 걸작들을 전시한다거나 언제 들어도 위안이 되는 명곡들을 무대에 올리는 공연이기에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경험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든 막노동에 가까웠다.
전시는 우선 국내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화가와 작품을 골라야 하고,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명화일수록 조건이 까다롭기는 말로 다할 수 없다. 교통 편의와 수용 인원을 고려해 전시장을 택해야 하고, 수익을 감안해 적절한 대관료를 산정하고 계약해야 한다. 또 시장의 흐름과 수지를 따져 합리적인 매표 단가를 산정해야 한다. 각종 인허가, 안전관리, 홍보와 마케팅, 미디어 플레이…. 한 번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출퇴근도 모르고, 밤낮도 알 수 없는 몇 달이 훌쩍 지나곤 했다.
그와 달리 공연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니 수월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오페라나 뮤지컬, 연극은 공연 기간도 짧지 않을뿐더러 클래식이냐 대중음악이냐, 출연자가 한 명이냐 여럿이냐에 따라 저마다 완전히 다른 설계를 해야 한다. 공연장, 무대, 세트, 음향, 조명, 특수효과 등은 전문적인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관계자와 협의를 해야 한다. 출연자의 구매력과 객석 수에 따라 객단가를 책정해야 하고, 선곡을 해야 하고, 큐시트를 짜고 대본을 작성해야 한다.
어떤 전시나 공연도 제작자의 입장에 서면 결코 예술이 아니다. 중노동일 뿐이다. 꽤 오래 방송사를 다니며 여러 분야의 업무를 경험했지만, 유독 전시공연 PD라는 직함에 마음이 머무는 것은 그때의 노동에 대한 심리적 반응인지 모르겠다. 누구나 가장 힘든 기억, 가장 아픈 기억은 오래 품고 사는 법이다.
그렇게 노동하던 전시공연 PD는 7년 전 회사를 나왔다. 직장 생활에 치여 시인으로서의 삶에 충실할 수 없었던 데 대한 반성이기도 했고, 더 늦기 전에 문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열망 또한 적지 않았다. 재직 중에도 “몸의 90%는 회사에 있지만, 정신의 90%는 문학에 가 있다”며 푸념을 토로하곤 했으니, 그다지 어려운 결정도 아니었다.
시간이 흘러 학위를 받고, 시간강사가 되어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퇴직 후에만 두 권의 시집을 더 냈고, 문학평론가란 직함도 얻었다. 첫 평론집을 냈고, 연이어 두 번째 평론집과 연구서가 곧 세상에 나온다. 시인들의 작품 세계를 분석하는 논문을 써서 학술지에 게재하고, 문예지의 편집위원으로서 회의도 하고 원고도 쓰고 있다. 시집 해설도 쓰고, 시가 오면 무릎을 꿇고 받아 적고 있다. 분주하고 바쁜 나날이다. 늘 꿈꾸던 전업 시인의 길이 당당하고 자랑스러운가 하면, 불비한 생활 여건에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몇몇 성당에서 작은 공연을 준비한다며 연출을 부탁해 오고 있다. 이미 다섯 번의 공연을 진행했다. 모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깊은 신앙심의 발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거절하지 못했다. 그렇게 ‘달빛콘서트’와 ‘별빛콘서트’는 퇴직한 지 7년이 된 한 전업 시인에게 다가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느님의 부름에 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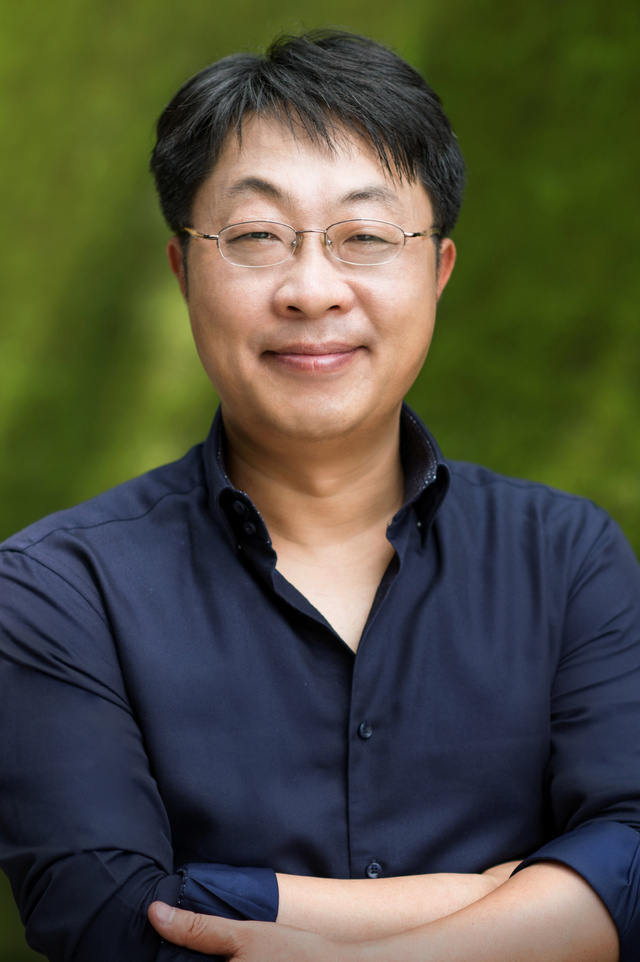
글 _ 김재홍 요한 사도(시인•문학평론가, 가톨릭대 초빙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