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詩하며 살아가는, 진짜 ‘시시한’ 시인




유난히 맑은 봄날이었다. 막 교실을 빠져나온 한 무리의 남학생들이 뛰어가기에 골목은 너무 비좁았으나, 빛나는 봄의 화음은 그들의 내면에 드리워진 그늘을 아주 말끔하게 씻어주었다. 그들은 소리치고 노래 부르며 뛰고 달렸다. 그 순간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솟구치는 청춘의 열정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날은 백일장이 열리는 날이었다. 수업을 빼먹고 대낮에 경주까지 간다는 건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에겐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 기회였다. 골목을 빠져나온 학생들은 큰길을 따라 거침없이 울산역으로 향했다. 그들은 모두 입상을 목표로 했지만, 그렇다고 상을 받는 데만 몰두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수업시간에 열차를 타고 경주에 간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었다.
그렇게 희열에 달뜬 한 무리의 불덩이들 사이에 한 시커먼 1학년 학생이 있었다. 그는 조금 전 문예부 교실에서 선배들로부터 ‘줄빠따’를 맞은 터였다. 문예부장을 비롯한 3학년들이 차례로 2학년과 1학년들을 때리고, 다시 2학년들이 1학년을 때렸다. 밀대자루로 한 사람이 10대씩은 매질을 하니 1학년은 적어도 200대 정도는 맞아야 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대구나 경주 애들보다 더 많은 상을 받아야 한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입상자는 겨우 한 명이었다. 갈 때와 달리 돌아오는 객차 안에서 말을 꺼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3학년도 2학년도 1학년도 침묵뿐이었다. 다짐의 매질을 시작한 문예부장부터 막 입학한 1학년까지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유일한 수상자였던 그 시커먼 1학년 학생은 달랐다. 꼴찌 상인 입선(入選)이었지만, 그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과 환희가 끓어올랐다. 땅을 디뎌도 구름 속을 걷는 것 같았고, 하늘을 보면 구름 위에 올라탄 것 같았다. 실로 그 도화지 한 장의 힘은 거대했다. 추위와 우울 속을 살던 아직 어린 영혼에게 그것은 좀처럼 식지 않는 시인에의 꿈을 심어주었다.
그날 이후 시커먼 1학년 학생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참으로 많은 상을 받았다. 입선이 아니라 장원과 차상을 무수히 받았다. 그것을 통해 만성적 우울을 이겨내고, 그것을 통해 생의 활력을 얻었다. 시의 길을 쉬지 않고 걸어 이제 등단 22년 차의 중견 시인에다 비평가이자 문학 연구자란 호칭까지 달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안다. 시인은 영광의 궁전에 무늬를 덧대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의 움막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이라는 것을. 그렇기에 시인은 언제나 詩詩하며, 진짜 ‘시시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시는 한없이 낮고 낮아져서, 더는 자기 아래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을 때까지 낮아져서 마침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러러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하느님을 따르는 길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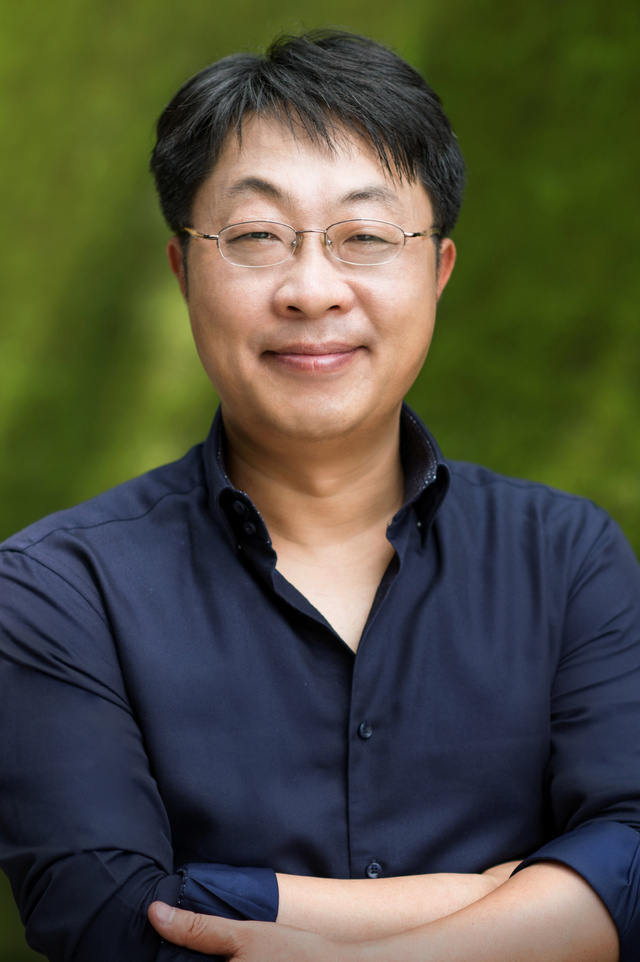
글 _ 김재홍 요한 사도(시인·문학평론가, 가톨릭대 초빙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