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열치열 ‘갓생’(God生) 살기] 하느님 숨결 깃든 자연에 내맡기는 기도 시간




자연과 함께하는 '엠마오의 길' 4복음서 통독 피정 체험기 자연 아름다움 통해 하느님 체험…복음 통독과 미사로 초자연 신학 경험
어디를 가나 숨 막히는 더위를 피하기 힘든 요즘이다. 그렇다면 이열치열, 하느님께로 향하는 타오르는 열정에 불을 지펴 잠시나마 ‘갓생(God生)’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 불길 한가운데를 걸으면서도 주님을 찬미할 수 있는 천사의 보호를 간구하며(다니 3,24 참조), 7월의 끝자락 제주에 자리한 주교회의 엠마오연수원(원장 김석태 베드로 신부)의 <자연과 함께하는 '엠마오의 길' 4복음서 통독 피정>을 찾았다.

미사, 영혼의 참된 휴식
아침 7시 미사 시작 20분 전인데도 벌써 모든 사람이 모여 성체조배를 하고 있다. 조용히 들어가 묵상에 잠긴다. 이내 피정 지도 사제인 신기배 신부(요한 사도·의정부교구 인창동본당 주임)를 따라 그레고리안 성가 창미사 연습을 한다. 악보 없이 따라 하려니 원래 악보가 없었던 옛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다.
성무일도와 함께하는 미사가 이어진다. 신부와 수녀들의 아름다운 선창이 귀와 입을 통한 깊은 기도로 이끌었다. 아울러 서광과 어울리는 푸른 스테인드글라스 빛이 눈으로의 묵상을 도왔다.
전날부터 신 신부는 말씀을 10회 이상 반복해서 읽고 올 것을 강조했다. 실천해 온 사람을 거수했더니 대부분이 손을 들었다. 신 신부는 강론에서 “덕분에 여러분은 이번 미사가 기다려졌을 것이고, 그만큼 마음에 새겨져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말씀의 전례에서 독서를 외워 낭송한 남기섭(프란치스코·청주교구 앙성본당) 씨는 “평소 피정을 할 땐 좋다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분명 성장은 했겠지만, 예전 나로 되돌아오는 것 같아 아쉬웠다”며 “미사를 제대로 봉헌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이번은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 신부는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고 쉬라고 하시기에(마태 11,28-30 참조) 피정은 온전히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나를 내맡기는 진정한 쉼”이라며 “평일 미사 또한 일상에서 맛볼 수 있는 영혼의 참된 휴가다”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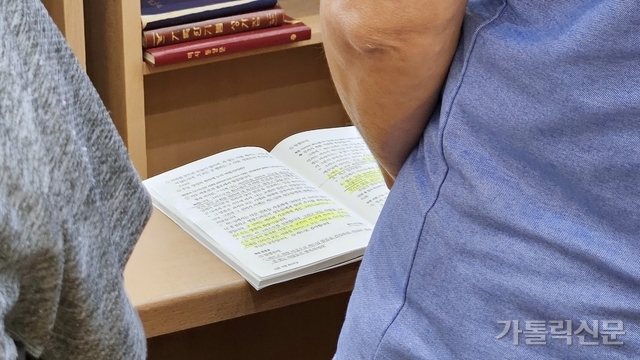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오늘은 절물 휴양림 12km를 걷습니다.”
실내에서의 강의 등 본래 일정과는 다른 야외 일정이 잡혔다. 기상 문제로 갑작스레 변동이 생긴 것이다. 시폰 블라우스에 청바지와 캐주얼 샌들 차림으로 부랴부랴 준비물을 챙겼다.
여름과 겨울 연 2회만 평신도에게 열려 있는 이 피정을 기획한 김석태 신부는 “여기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4복음서 통독과 미사에서 ‘초자연’ 신학을 경험하며, 각자 단계에 맞는 기도로 ‘신비’ 신학을 체험할 수 있다”며 “내 창조주이자 구원자를 만나 성화 되는 하느님 체험이 진실된 휴식”이라고 설명했다.
#영광의 신비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이내 멈춘다. 휴양림에 들어서자마자 하늘까지 곧게 뻗은 삼나무가 경이롭게 펼쳐져 있다. 맞닥뜨리는 대자연에 압도돼 묵주기도 영광의 신비를 시작했다. 제주 휘파람새가 유독 곱게 지저귄다. 그늘을 선사해 주는 숲이 고맙다.
오로지 단순하게 걷기만 하다 보니, 주변의 여러 자연 현상에 어린아이처럼 반응하게 된다. 도시에서도 들었지만, 바로 옆에서 우는 까마귀 소리도 새롭다며 “발음이 억수로 좋네”라고 까르르 웃는다. 이름 모를 들꽃들이 예쁘다며 감탄하고, 헌화회 회원으로 보이는 누군가는 오밀조밀 피어있는 그대로가 이미 완성형 꽃꽂이라고도 놀라워한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라며 가톨릭 성가 <주 하느님 크시도다>를 읊조린다.


#고통의 신비 카메라를 들고 걷자니 조금은 거추장스럽다. 이보다 훨씬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더 높은 언덕길을 가셨을 예수님이 떠오르며 고통의 신비를 묵상한다. 그래도 “장비 때문에 목 아프지 않냐”며 한 마디씩 챙겨주는 분들 덕분에 걸음이 가벼워진다. 평소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또 한 번 느낀다.
평소엔 그냥 당연하게 지나쳤던 시설들이 눈에 띈다. 누구일지, 나보다 먼저 이곳에 와서 푹신하게 멍석을 깔고 물웅덩이에 징검다리를 놓아준 손길들이 감사하다. 길이 조금 험해지다 보니 앞 사람이 내딛는 발걸음을 주시하게 된다. 앞선 이, 또 그 이전 이 길을 걸은 이들은 얼마나 힘든 길을 헤쳐 나갔을까.
#환희의 신비 휴식 시간, 가이드를 하던 김석태 신부가 “정상까지 가시죠”라고 권유한다. 아무래도 여러 사정상 중간에서 내려오는 코스를 선택할까 했었다. 그러나 나는 “네”라며 성모님처럼 순명하는 마음을 꾹꾹 담아 환희의 신비를 시작했다.
한 줄로 걷기에 담소보다는 묵상에 집중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6.5km 표지판을 지나자 벌써 이렇게 온 것에 서로가 대견한 듯 “여럿이 오니까 오지, 못 와요”라는 말이 오간다. 아프리카 속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떠오른다.
대망의 점심시간. 도시락을 꺼내는 손길이 설렌다. 멸치 볶음밥과 수녀님들이 직접 담갔다는 볶음김치 조화가 꿀맛이다. 마무리는 역시 컵라면과 믹스커피라며 서로 무겁게 들고 온 보온병의 천금 같은 뜨거운 물을 나눈다.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이 흐른다.


#십자가의 길 식사 장소를 떠나니 본격적으로 돌길이 나온다. 조금 힘든가 싶던 찰나 “여기에서 내려가실래요?” 선택의 순간이 왔다. 나는 연중 제 16주일 복음(루카 10,38-42)의 마리아처럼 이제 내가 스스로 좋은 몫을 택한다.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느님 자비 십자가의 길을 바친다.
습도가 높아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 그만큼 몸 안의 독소와 불순물이 빠지는 느낌이다. 뿐만 아니라 내 안의 근심, 걱정, 불안과 나쁜 기운이 함께 발산되는 듯하다. 그런데 양말 안에 뭔가가 달그락거린다.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꾸 신경이 쓰인다. 역시 사람은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당장 내 신발 속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더 크게 체감하는 것 같다.

#빛의 신비 정상이 가까워 오자 하늘빛이 비친다. 어렴풋이 햇살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빛의 신비를 봉헌한다. 절물오름 분화구에 도착해 둘레길을 걷다가 전망대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만끽한다. 안타깝게도 구름에 가려 한라산은 보이지 않지만, 덕분에 나무 그늘을 벗어나도 햇볕이 직접 내리쬐지는 않는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든다.
지름길로 내려오니 사찰의 풍경소리가 우리를 반긴다. 절물약수터에 들러 다디단 생명의 샘물을 마신다. 이어 족욕탕으로 옮겨 옹기종기 앉아 냉수 족욕을 해본다. 서로 부끄러운 발을 드러내며 쑥스러워한다. 이 발을 친히 씻겨주신 예수님을 떠올린다.
다 내려오자 여기저기서 “아쉽다”는 말이 터져 나온다. 윤선희(드보라·마산교구 삼계본당) 씨는 “신앙인으로서 피정의 기회를 갖는 것은 삶에 기쁨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남기섭 씨는 “남은 인생 설계에 대한 응답을 구하려는 인간적 바람을 가지고 왔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하느님과의 사랑을 묵상하며 걸은 좋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phj@catimes.kr
박효주 기자
phj@catime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