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
김혜윤 수녀의 성서말씀 나누기 (37) 욥기 4 욥기의 구조 (2)
김혜윤 수녀(미리내 성모성심수녀회·광주가톨릭대 교수)
입력일 2003-10-19 09:56:00
수정일 2003-10-19 09:56:00
발행일 2003-10-19
제 2369호 6면




하느님을 ‘엘’ ‘엘로아’로 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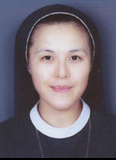
지난주 필자는 욥기 전체의 구성을 소개하면서, 이 책이 크게 운문부분과 시문부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이 운문 부분의 구성에 주목해보고자 하는데, 다른 성서에 비해 비교적 분량이 많은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운문 부분이며, 또한 복잡해 보이는 진행 안에 매우 발전된 체계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운문(본론 부분)의 구성
운문 부분은 크게 「전반부:욥과 친구들의 논쟁」과 「후반부:하느님의 등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욥과 친구들의 논쟁(3, 1~37, 24)
이 부분은 본론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며 상당히 긴 분량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은 다시 ① 「세 친구와의 논쟁」과 마지막 친구로 등장하는 ② 「엘리후의 연설」로 구분된다.
① 세 친구들과 욥의 논쟁(3, 1~31, 40)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아래에서 제시된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흥미로운 것은 「야훼」라는 이름이 이 긴 논쟁에서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 대신 하느님은 엘, 엘로아, 샤다이(전능하신 분)등으로 호칭되고 있다. 아무튼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진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은 아래와 같은 구도로 반복되고있다.
첫째 대화:욥(3장)-엘리바즈(4~5장)-욥(6~7)-빌닷(8)-욥(9~10)- 소바르(11).
둘째 대화: 욥(12~14장)-엘리바즈(15장)-욥(16~17)-빌닷(18)-욥(19)~소바르(20).
셋째 대화:욥(21장)-엘리바즈(22장)-욥(23~24)-빌닷(25)-욥(26~27).
이 구도가 보여주는 특이한 점은 세 번째 대화에서 소바르의 연설이 생략되어있다는 점이다. 학자들은 이러한 생략이 원문 자체의 훼손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꿈란에서 발견된 욥기 타르굼(11 QtgJob)에도 소바르의 연설은 생략되어있다. 필사와 해석작업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훼손된 본문이 고착되어 전수되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세 친구들과의 대화 다음에 등장하는 28장(지혜 찬가)은 후대 첨가된 부분으로 추정되는데,
대화부분(3~27장)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선언한 욥과 하느님께 최후 도전을 시도하게 되는 29~31장 사이를 연결시키는 교량역할을 하기 위해 첨가되었다고 보고있다.
29~31장은 하느님의 직접적 개입 이전에 욥이 발설하는 마지막 독백 부분으로, 여전히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자하는 그의 최종적인 입장이 제시되어 있다.
② 엘리후의 연설(32, 1~37, 24) 부분은 욥의 독백에 대한, 마지막 친구의 연설이다. 역시 후대 첨가 부분으로 추정되는데, 엘리후라는 인물은 이 부분에 갑자기 등장하였고, 연설이후 이내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욥기의 다른 부분과 연속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2) 하느님의 등장(38, 1~42, 6)
운문부분의 후반부에서는 하느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신다. 하느님을 만나기를 그토록 열망하던 욥에게 이제 직접 나타나심으로써 이 긴 갈등의 과정을 해결해주시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 역시 매우 체계적인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느님의 연사와 욥의 응답이 서로 교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38, 1~40, 2)->욥(40, 3~5)->하느님(40, 6~41, 26)->욥(42, 1~6).
고통, 말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
욥기의 저자는 하느님을 만나기까지 욥을 극도의 방황과 갈등으로 몰아넣는다. 그의 친구들은 고통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구구절절 논함으로써 욥의 고통을 해결하려 하지만,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는 그 어떤 해결점도 발견하지 못한다. 친구들의 복잡한 담론들은 오히려, 이 고통이 웬만해서는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만을 고조시킬 뿐이었다. 사실, 친구들이 자신들의 좁은 소견으로 고통과 삶을 논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고통과 삶을 아직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오류일 수 있다. 고통이나 삶은 논쟁이나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내고 극복해야할 현실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여러 지면을 통해 「감히」 고통과 삶을 논하고 그 전망을 제시해왔다. 아직 내가 고통과 삶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라는 반성을 이 글을 쓰는 내내 하고 있다.
김혜윤 수녀(미리내 성모성심수녀회·광주가톨릭대 교수)
Catholic Pick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