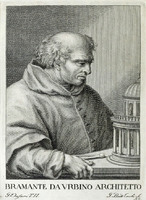종합
교회 재일치의 상징 - 공현대축일
백 쁠라치도ㆍ신부·왜관피정의집 원장
입력일 2011-04-14 09:40:20
수정일 2011-04-14 09:40:20
발행일 1978-01-15
제 1088호 2면




그리스도 탄생과 공현대축일의 유래 동방의 성탄일이 서방의 공현축일 원래 축일은 1월 6일이나 각국마다 다르게 기념 로마교회선 성탄연장 축일로 지내
그리스도의 탄생일은 우리가 정확히 알수는 없다. 그래서 교회는 전례적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념하기위해 적당한 날을 택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가 지내고 있는 12월 25일 성탄일은 로마인들의 신화에 나오는「태양 신」(SOL INVICTUS=죽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이다. 태양은 12월 21일에 가장 지상 가까이 내려오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이날을「태양이 죽은 날」로 표현했다. 이후 25일경에는 시각적으로 태양이 서서히 올라감을 느낄 수 있어 이날을 태양신의 탄생일로 본 닷하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태양으로 보고 참된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태양이기 때문에『그날에게 영세주었다』또는『그리스도화 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날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하게 된 것이다.
12월 25일은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제국에도 큰 축일로 지냈으며 교회가 이날을 성탄일로 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신화를 비 신화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러 문화권이 공존해있던 로마제국에서 라틴문화권의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지냈으나 희랍문화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축일을 1월 6일에 지냈으며 이날을 EPIP ANIA(신의발현=公頭)라고 불렀다.
따라서 희랍문화권에서는 이날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냈으며 이것이 오늘날 서방가톨릭에서 지내는 공현축일(삼왕래조축일)의 유래이다.
초대교회후기(3세기)에는 각 지방의 특징을 존중했고 회일주의적인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라틴문화권(서방가톨릭)에서는 12월 25일에 그리고 희랍문화권(동방가톨릭)에서는 1월 6일에 각각 지냈다.
그런데 5~6세기경부터 로마에서 로마의 권위를 위해 어떤 획일적인 통일을 강요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희랍문화권에서 지내고 있는 1월6일 그리스도 탄생일에 대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 후 12세기에 열린「플로렌스」공의회에서 동서방 교부들이 함께모여 그리스도의 탄생일을「화해의 상징」으로 지내자고 결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두 번 지내는 모순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성이 동서방교회가 각각 신학적으로 의의를 달리했기대문에 그 당시는 모순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 왜냐하면 성탄일을 서방교회에서는『하느님의 아들이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인간성에 촛점을 두었고 동방교회에서는 오히려『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천주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12월 25일의 입당송에는『우리를 위하여 아기가 태어났다. 우리를 위하여 아기가 주어졌으니…』라고 되어있으며 공현축일에는『보라! 임금이신 주께서 오시니 나라와 권세 또한 이날 복음도 삼왕의 그리스도방문을 백함으로써 이날의 의의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희랍문화권에서는「왕은 지혜롭고 훌륭한 학자여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예수를 찾은 3명은 왕이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더구나 성경에 보면 이 3명이 많은 일행을 데리고 왔다는 말이 있고, 또 아기예수를 찾지 못해 헤로데왕에게 여쭈어 보았다는 말은 왕이 아니었으면 할 수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서방교회의 일반 신자들은 이와 같이 두개의 탄생일이 있는 것은 모순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날(1월 6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기보다는 3왕의 축일(공현축일)로 느꼈다.
서방교회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신학자들만 1월 6일의 원뜻을 알고 있을 뿐 일반신자들은 3왕대축일로 알고 지내왔다.
그러면 일선 사목자들이 공현축일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목방침을 제시해 보겠다.
제2차「바티깐」공의회 때 많은 전례학자들은 공현축일이 없어질 것으로 추측했으나 이 축일의 오래된 역사 때문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동방교회와의 일치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든 싫든 이날을 뜻 깊게 지내야할 의무가 있다.
공현축일은 예수성탄의 연장으로서 지낼 수 있다.
교회는 다른 대축일에도 하나의 연장축제를 덧붙였다.
예를 들면 부활대축일→그도스도 왕 대축일(2층 부활 날)/성 목요일→예수성체성혈대축일/성금요일→예수성심대축일등과 같이 같은 신비를 두 번 지내면서 강조하는 면에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강론 때도 이 의미를 잘 설명해줄 필요성이 있으며 띠또서 2장11~13절 같은 성경귀절은 공현축일에 적합한 내용이다.
그리고 공현축일은 1월 6일에 지내는 것이 타당하나 교황청에서 사목적인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국 주교단의 요청이 있을 때 일요일로 옮기는 것을 허락하고 있으며 한국교회에서는 1월 첫째주일에 축일을 지내고 있으나 금년에는 1월천주가 신정이기 때문에 1월 8일 둘째주일에 지냈다.
영국, 미국, 스페인 등지에서는 1월 6일을 공휴일로 지낼 정도로 근축일로 지내고 있으며 서독의 경우는 일요일에 축일을 지내는 지방이 있는가하면 어떤 지방에서는 1월 6일에 지내는 등「혼란스러운 대축일」이다.
우리는 공현축일을 통해 교회의 재일치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동·서방교회가 축일을 각각 다른 날에 지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도 이것을 가지고 양교회가 싸워온 것은 잘못이다.
성탄축일뿐만 아니라 부활대축일 때문에도 동·서방교회는 더 많이 싸웠다.
원래 이런 문제는 시시한 것으로 큰 문제로 삼지 말아야한다.
그러므로 이문제가「플로렌스」공의회 때 타협을 본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볼 수 있다.
만일 마틴 루터시대 때 즉「트리엔트」공의회 때 이와 비슷한 타협의 태도를 보여주었더라면 아마도 루터교회는 발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오늘날까지도 교회당국에서는 어떤 때 대수롭잖은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에 비춰볼 때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날(1월 6일)은 교회일치 재일치화의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모든 교과나 교회에서 이날부터 1주일간을 교회일치주간으로 지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날 강론 때 교회일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본다.
백 쁠라치도ㆍ신부·왜관피정의집 원장
Catholic Pick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