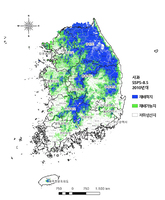열린마당
[주말 편지] 성호경과 함께하는 하루 / 남민옥
남민옥(데레사)시인
입력일 2019-05-28
수정일 2019-05-28
발행일 2019-06-02
제 3147호 22면





지난해 주말 여행길에 수원교구 하남 구산성지에서 미사를 드렸다. 그때 신부님께서 강론 시간에 성호경에 대해 아주 재미있고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다. 핵심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눈 뜨자마자 성호경을 하라는 말씀이었다. 그 후로 성호경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습관이 생겼다. 그뿐만 아니다. 화나는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성호를 그었다.
성호경은 이전에도 내가 아는 기도들 중에 가장 좋아하고 또 자주하는 기도였다. 성호를 그을 때면 마음에 가만히 평화가 스며든다. 오른손을 들어 천천히 이마와 가슴,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를 차례로 찍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 그 모습은 내게 ‘가톨릭’을 받아들이게 한 첫 계기이기도 했다.
1960년대 말경이었다. 당시 농촌 봉사활동으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학생 봉사단이 찾아왔다. 봉사단은 우리 집 사랑채에 묵었다. 그때 학생들이 식사하기 전에 꼭 손을 들어 성호를 긋는 것이었다. 그때는 그 기도가 성호경인지도 몰랐다. 그런데도 그 모습이 아주 신기하고 거룩해 보였다.
지금은 그 곳에 성당도 생겼지만, 당시만 해도 마을 근처에는 성당도, 신자도 없었다. 개신교회만 세 곳 있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본 학생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다. 그 모습이 내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각인이 돼 있었나 보다.
훗날 직장 가까이에 서울 주교좌명동대성당을 보았을 때였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성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가슴이 뛰었다. 기도도 할 줄 몰랐지만, 그냥 감사 기도가 흘러 나왔다. 그러면서도 세례를 받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혼 후 두 아이가 생기면서 더 미루지 않고 세례를 받기로 했다. 아이들을 신앙 속에서 키우고 싶어서였다. 그렇게 바라던 가톨릭 신자가 됐다. 곧이어 남편도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소망대로 성가정을 이루게 됐다.
그 무렵 꿈을 꾸었다. 우리 가족이 사는 아파트 앞 잔디밭에 눈부신 성모상이 서 있고, 그 잔디밭은 성모 동산으로 아름답게 가꿔져 있었다. 성모님을 향해 성호를 긋고 뒤를 돌아보니, 우리 집 거실에서 어떤 신부님께서 성체를 모시고 계셨다.
너무도 설레고 선명한 꿈이었다.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하다. 그런데 그 후로 가족들 중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차례로 세례를 받게 됐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큰 은총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돌아보면 농촌 봉사단 학생들이 성호경으로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갔던 것 같다. 그 학생들에게 너무도 고맙다. 이렇게 신자 한 명 한 명의 작은 행동 하나가 전교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느낀다.
지금도 나는 십자를 그으며 성호경을 자주 외운다. 특별한 청원을 하지 않아도 성호만 그으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실 것만 같다. 무엇보다 성호를 그을 때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진다.
나에게 성호를 긋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정화해 주는 행위다. 마음이 복잡할 때도 성호를 그으면 이내 마음이 고요해진다. 성호는 날마다 내 안에 새기는 십자가다. 성호를 그을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기억하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는 것을 느낀다. 앞으로도 성호경을 즐겨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민옥(데레사)시인
Catholic Pick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