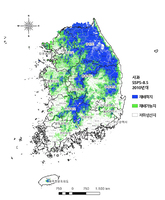열린마당
[신달자의 주일오후] 12월에는 따뜻한 인사를 합시다
입력일 2009-12-21
수정일 2009-12-21
발행일 2009-12-27
제 2678호 27면




12월에는 자존심을 낮춰 화해라는 따뜻함 속으로 들어가길 바래본다

아파트 부근의 나무들이 홍옥처럼 붉게 익어가고, 먼 산의 몸체가 핏빛처럼 타올라 가슴이 콱 막히던 가을은 벌써 가버렸는가. 바라보면 눈물이 확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깊은 가을은 어느새 보이지 않고 회색빛의 쓸쓸한 겨울이 찾아왔다.
가을은 잊었던 상처까지 붉게 불을 밝혀와 내내 마음이 저리고 아팠다. 오죽하면 ‘가을병’이라고 했던가. 그러나 겨울은 그 상처들을 서서히 잊게 해 긴긴 묵상으로 들어가게 한다. 겨울은 쓸쓸한 계절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가장 뜨거운 계절일지도 모른다.
12월이다. 왠지 바쁘다. 한 해를 보내는 망년회 때문이 아니다. 뭔지 모를 초조감이, 아니 확실한 불안감이 추운 옷깃을 더 오므리게 한다. 어디엔가 누구에겐가 무엇인지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 그것도 아주 차분하게 진정성을 갖고, 아주 자연스럽게 정 깊은 인사를 하고 싶어진다.
떠나가는 2009년에게는 물론이다. 조금은 미워했지만 마음에는 그리움이 아직 남아있는 친구에게도 그렇다. 늘 경쟁자였지만 이 겨울의 묵상에서 결코 뺄 수 없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천국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정겨운 인사를 하고 싶다.
매듭을 풀고 싶다. 마음속의 한 가닥 홀쳐매진 매듭을, 마음 저리고 아픈 그 매듭을 풀고 싶다. 상대방이 먼저 입을 열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먼저 입을 열어야 한다. 그렇게 다짐해도 적어도 열흘은 걸린다.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하면 그 매듭은 결국 다음해로 넘어간다. 매듭을 풀고 싶다.
12월에는 모두 조금씩 착해진다. 나 역시 12월에는 스스로 자존심의 키를 낮춰 ‘화해’라는 따뜻한 핵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래본다. 추위 때문이 아니다. 12월에는 자기주변의 거친 돌길을 매만지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이다. 매끄럽고 반들반들한, 그래서 마음이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기를 사람들은 꿈꾼다. 입을 닫고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이 겨울은 다시 추워질 것이다. 그래서 인사를 해야 한다. 내가 먼저 입을 열어야 한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그 마음을 조금 더 확장해 긴 편지를 써보면 어떨까. 그러면 얼었던 발끝이 환하게 웃을지도 모른다. 한 해를 보내는 겨울의 인사를 한 해를 다시 맞는 겨울의 인사로 이어지게 한다면, 이 겨울 우리는 좀 더 바빠질 것이다. 우리의 겨울은 좀 더 따스해질 것이다.
돌아서서 가는 한 해를 보면 할 말이 많을 것이다. ‘미안하다’ 나는 이 말을 가장 많이 할 것 같다. ‘고마워’ 이 말도 많이 할 것 같다. ‘감사해’ 이 말 또한 많이 할 것 같다. ‘잘 해 볼게’란 말도 많이 할 것 같다. 2009년이 시작되면서 약속했던 일을 나는 다 이루지 못했다. 그 결심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 나는 정말 미안하다. 고마운 것도 많다. 내가 주춤거릴 때 나를 달리게 한 것도 우리들의 약속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 정말 고맙다.
이제 2009년이 떠난다. 곧 2010년이 올 것이다. 우리는 다시 새해와 인사를 해야 한다. 새로운 약속들일 게 뻔하다. 2010년이 갈 때도 다시 ‘미안하다’로 시작하지 않기를 빈다. 가는 해와 오는 해에게 정중한 인사를 하려고 한다. 가고 오는 이 시간은 엄격하다. 우리는 언제나 새 시간 속에 있다. 그 생각을 하면 마음 떨린다. 일 초 일 초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도 지난 시간에 머무를 수 없다.
오, 눈부신 시간이여! 감사하다. 살아있다는 것은 시간을 체험하는 일이다. 이보다 더 눈부신 일이 있겠는가. 건강한 목소리로 외치고 싶다. ‘잘 가십시오. 그리고 잘 오십시오.’
※ 그동안 집필해주신 신달자 님과 애독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1월 3일자(신년호)부터는 소설가 구자명 님의 칼럼이 연재됩니다.
Catholic Pick
많이 본 뉴스